『내일 아침에는 눈을 뜰 수 없겠지만』 편집 후기
- 2020-04-01 15:06:00
- 사계절
- 404
- 0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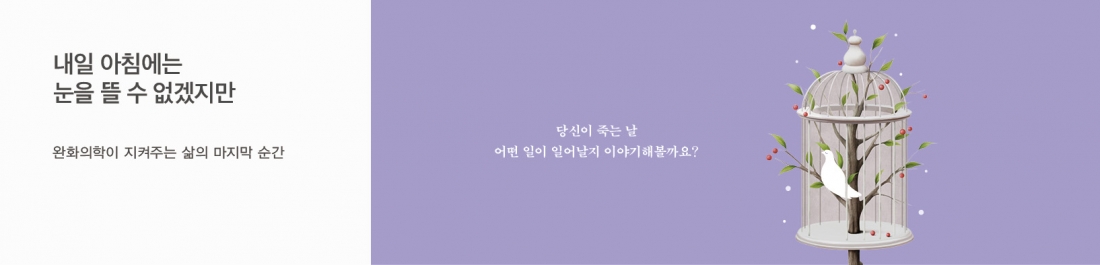
저는 밤마다 드라마 보는 게 낙인데, 메디컬 드라마는 계절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와 일상을 채워줍니다. 올해도 벌써 <김사부 2>의 뒤를 이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방송 중이라 즐거움 마를 날이 없죠. 이 장르에서 꼭 빠지지 않는 장면이라 하면, 당연히 이것입니다!
“삐-삐-” 심박과 산소포화도를 알리던 모니터가 큰소리로 심장이 멈췄음을 알린다. 의사는 환자의 가슴팍 위로 뛰어올라 CPR을 시작한다. “하나, 둘, 셋”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의사의 윗옷이 땀에 젖으면, 옆에 선 의사가 “손 바꾸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다시 환자의 가슴팍 위로 뛰어오른다. 화면은 다시 한 번 붉은 글씨로 숫자 0이 표시된 모니터를 비추고, 간호사는 제세동기를 준비한다.
이어지는 상황 ①: 의사의 처치에 반응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토닥이는 의사들.
이어지는 상황 ②: 환자의 심장은 영영 다시 뛰지 못한다. 이제 그만 CPR을 멈추라며 동료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리는 의사.
우리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혹은 진짜 병원 응급실에서) 본 환자를 살리려 애쓰는 의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드라마 속 주인공과는 꽤 다른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환자를 만나기 전 먼저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우리더군요. 그런 다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 두 잔을 쟁반에 받쳐 들고 환자의 방으로 가서 말합니다. “임종이 어떤 것일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걱정된다고요? 또 용기를 잃을까 봐 걱정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당신에게 임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줄게요.”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 알려주겠다고요?] 그는 영국의 완화의학 의사 캐스린 매닉스(편집부에서는 ‘캐 선생님’이라고 부른답니다)입니다. 캐 선생님은 거의 40년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선 환자들은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대신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부탁합니다. 눈물 흘리며 삶을 참회하는 대신 엄마에게 주고 갈 쿠션을 뜨며 조잘조잘 떠들지 않나, 어떨 땐 산소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지역 축구 클럽을 응원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호스피스 병동 환자들이 말이에요. 흔히 상상하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모습과는 꽤 달랐습니다. 죽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어둡고, 아프고, 당연히 슬프고…. 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날, 저는 아마도 숨도 쉬지 못할 거라고 늘 생각했거든요.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 벌써 그 경험을 했고요. 그런데 뭐지, 이 긴장감 없음은? ‘음…, 어…’ 하며 꾸물대고 있을 때, 캐 선생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보통의 죽음은 이런 모습이라고요. 익숙한 공간에서, 사랑하는 이들 곁에서, 통증 없이, 숨이 멈춘 줄도 모르게 잠들 거라고요. 그럴 수 있도록 돕는 게 자신 같은 의사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겁낼 필요 없다는 말, 이건 바로 제가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가제본 이벤트를 통해 책을 먼저 읽은 독자들도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나와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만날 의사가 캐 선생님 같은 사람이길 바란다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미안해. 용서해줘. 괜찮아. 사랑해” 같은 말을 지금부터 더 많이 하겠다고 말이에요.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편집을 마친 책을 다시 읽어보니 캐 선생님이 가르쳐준 건 죽는 법이 아니라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혼란한 요즘, 어쩌면 이 책이 여러분 삶의 의미를 다시 확인시켜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집자 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