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식사, 마지막 음식, 그리고 마지막 기억 -『열여섯 밤의 주방』을 읽고
- 2019-03-28 11:15:00
- 사계절
- 470
- 0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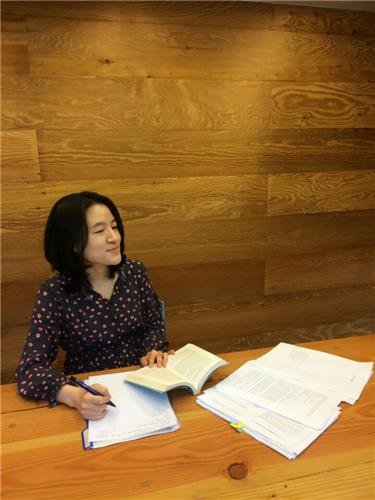
탁경은(소설가, 『싸이퍼』 작가)
음식을 향한 중국인들의 열정은 좀 과하다 느껴질 때가 있다. 영화 <음식남녀>의 잔상 탓일 수도 있겠다. 튀기고 볶고 찌고 지지고 섞어 만든 산해진미를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채운다. 듣도 보도 못한 식재료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 규모와 화려함에 입이 떡 벌어진다. 음식을 다루는 중국 소설이라. 읽기도 전에 침이 고이고 마음이 끌렸다.
작가가 ‘작가의 말’에서 이야기한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라는 특집 기사를 나 역시 읽은 적이 있다. 미국 사형수의 사형 집행 직전 하루에 대한 글이었다. 죽기 전 사형수에게는 뜨거운 물 샤워와 마지막 딱 한 통의 전화가 허용된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는 먹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는데 가장 요청이 많은 것은 치즈버거와 감자튀김이라고 한다.
그 기사를 읽으며 나 자신에게도 물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은 무엇일까? 미국 사형수들이 치즈버거를 골랐듯이 소소하고 일상적인 음식이 떠오른다. 엄마가 소고기, 배추, 무, 대파를 양껏 넣고 푹 끓여 주는 얼큰한 소고깃국. 동생과 내가 좋아하는 토마토소스 스파게티와 시저샐러드. 가족들이 모두 좋아하는 삼겹살이나 돼지갈비.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된장찌개, 만둣국, 칼국수, 순댓국, 떡볶이 등등 끝도 없이 음식들이 떠오른다.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 목록을 밤새 이야기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여기 지옥주방이 있다. 생전에 먹은 음식 가운데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을 뭐든 시켜먹을 수 있는 곳. 망천하를 건너기 전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억을 그곳에 남겨둘 것인가.
인간의 여러 욕망 중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식욕이다.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는 단지 식욕을 채우는 행위를 넘어서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다. 음식의 재료를 정성껏 기른 사람, 재료를 솜씨 좋게 음식으로 만든 사람, 완성된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이 있으니 먹는다는 일은 사회적이다. 재료가 자연에서 자란 시간과 공간, 요리사와 먹는 사람이 자란 환경, 음식을 함께 먹는 동안 흐르는 시간과 장소의 공기가 담기니 문화적이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먹어온 음식에는 구체적인 기억과 향수가 남고 음식을 먹는 동안 주고받는 기운과 대화가 빼곡히 박혀 있으니 무척 개인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은밀히 개인적이면서 중국의 문화적 색깔이 오롯이 담겨 있다.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종횡단하며 중국의 근현대사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인 변화가 인물들의 스토리와 함께 맛깔스럽게 차려진다.
어떻게 보면 『열여섯 밤의 주방』은 중국 음식 영화가 떠오를 정도로 대륙의 활력과 향기가 폴폴 나고 어떻게 보면 일본 음식 영화 <심야식당>처럼 내밀하고 소소하다. 열여섯 명의 인물이 나와 자기 삶에서 가져가기 싫은 기억을 꺼내지만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기억이 없다. 어느 것 하나 좋지 않고 나쁜 삶이 없다. 간혹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인물도 나오지만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되었는지 생각하다 보면 안쓰럽기도 하다. 열여섯 명의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살아낸 삶에서 함께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삶까지 나오니 소설 안에서 백 명도 넘는 사람들을 만나는 셈이다. 그래서일까. 이 문장들이 유독 마음에 남았다.
다시 연락할 수 있으면 인연이고 할 수 없어도 인연이다. 어긋나는 것도 인연이다. (185쪽)
가장 와 닿았던 인물을 찾아봤다. 소설 중반에 나오는 ‘여덟 번째 밤: 박하소고기쌀국수’ 주인공을 어렵지 않게 꼽을 수 있었다. 청년은 삶과 생존 사이에서 고뇌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한다. 그가 겪어내야 하는 생의 시련은 이 소설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에 비하면 별것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가 감내하고 있는 정신적 고민과 내적 시련의 파고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크고 깊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의 절망과 고뇌에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들에.
대학 다닐 때 온갖 감정에 휘말렸던 청년은 어느 순간 정이라는 게 정말 얄팍하고 빠져들긴 쉬워도 벗어나긴 힘든 것임을 깨달았다. ‘구해도 얻을 수 없는 지경’까지는 아니지만 인간관계는 ‘말실수, 사죄, 화해’의 끊임없는 순환 같았다. 무슨 악보 같기도 했다. 좋을 때는 세상을 환하게 밝히다가도 실망하면 잔잔한 음 하나만으로 심장을 부숴 버릴 수 있었다. 끊임없이 순환하는 노래를 멈추고 싶을 때면 언제든 멈출 수 있었지만 빨리 멈출수록 초조함이 심해졌다. (187쪽)
그리고 이런 문장엔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치며 공감하지 않을까.
하고 싶은 일이 무척 많았지만, 하나의 열정적인 이유는 수많은 현실적인 이유에 밀려 소멸해 버렸다. (188쪽)
마지막 다리에 오르며 그 순간까지도 두려워하고야 마는 그의 마음을 나는 함께 나눴다. 그는 홀연히 떠났지만 여기에 남은 나는 그가 남긴 삶의 고뇌를 이어 나간다. 성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대체 그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용감하게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가 남긴 생각들을 부여잡다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커피를 한 잔 마신 뒤 한껏 기지개를 켜며 몸을 풀고 싶다. 하얀 종이를 꺼내 소설 속 인물이 그랬던 것처럼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니?”라고 적은 뒤 눈물이 날 때까지 하나씩 적어 내려가고 싶다. 과연 나는 몇 분 동안 몇 개를 적으려나. 어느 대목에서 울음을 터트리려나. 문득 소설을 다 읽고 나자 이런 생각이 밀려들었다.
누구에게나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의지할 것이 하나쯤 필요하다.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명성이나 좋은 직업, 혹은 멋진 차나 명품 가방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 그것은 음식일 수 있다.
누구나 먹어야 산다. 살기 위해 먹지만 희한하게도 누구도 오로지 살기 위해서만 먹지는 않는다. 생존을 위해 먹는 행위에 집착하지만 실은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 생을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음식으로 위로받고 또 하루 살아갈 힘을 얻고 꼭 하고 싶거나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한다. 음식을 통해 감정을 나누고 인생을 공유하고 말보다 더 깊이 있는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맹파의 음식이 그러했듯 지금 당장 이곳에서, 소중한 기억이 담긴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보자.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서로의 입에 넣어주자. 잊어야 할 일은 마음껏 잊어주고, 더불어 나눠야 할 감정은 풍성하게 누리자. 혼자도 좋지만 가끔은 시간을 내 꼭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자. 그 힘으로 모두 인생이라는 다리를 뚜벅뚜벅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